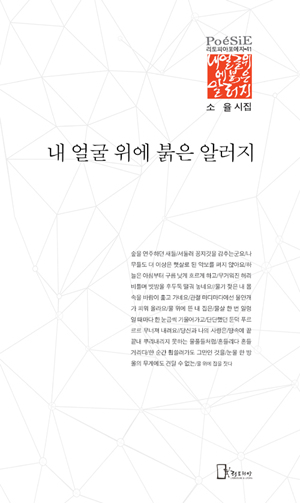발간도서
내 얼굴 위에 붉은 알러지/소율 시집
페이지 정보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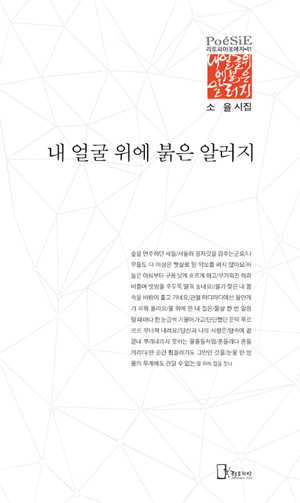

리토피아포에지․41
내 얼굴 위에 붉은 알러지
인쇄 2016. 4. 20 발행 2016. 4. 25
지은이 소율 펴낸이 정기옥 펴낸곳 리토피아
출판등록 2006. 6. 15. 제2006-12호
주소 402-814 인천 남구 경인로 77(숭의3동 120-1)
전화 032-883-5356 전송032-891-5356
홈페이지 www.litopia21.com 전자우편 litopia@hanmail.net
ISBN-978-89-6412-061-3 03810
값 9,000원
1. 저자
소 율 시인은 인천 덕적도에서 출생하였다. 본명은 김희경이며 호는 갈매이다. 월간 예술세계를 통해 등단하였고, 죽란시 동인회장, 예술시대작가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국민대에서 국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국민대 강사를 역임한 바 있다. 시집으로 브래지어가 작아서 생긴 일과 다수의 공저가 있다.
2. 자서
햇살 유난히 따사롭던 어느 해 봄, 거리엔 붉은 장미꽃 넌출 대며 피어올랐다. 햇살 아래 붉은 장미꽃 마침내 내 얼굴을 타고 꽃들 송이송이 피워 올렸다. 내 얼굴 위에선 한 여름날 태양광처럼 붉은 열꽃이 아주 오랫동안 향기로웠다.
오랜 망설임… 끝, 그럼에도 또 다시 빛에게 빚을 지기 위해 떠나는 또 하나의 발자국.
2016년 봄
소율
3. 목차
제1부 물 위에 집을 짓다
물 위에 집을 짓다 15
파도 16
그 곳, 안개가 있는 18
로스코 채플―작품 넘버‧5 20
괄호 채우기 22
겨울나무 위 눈꽃 24
풍경―도시에 비 26
효孝에 관한 고찰 28
하나님 오 하나님 30
모닥불 32
네비게이션 34
그 남자의 하루, 되돌이표 후렴구 같은 36
초분 순례 38
풀등 40
언필칭言必稱 시詩랴거든 42
산 바다 하늘처럼―결혼축시‧1 44
우린 모두, 그렇게 후후―스마트폰 시대 46
제2부 봄이면 가끔 통증
바다로 가는 길목 49
벚꽃축제 50
봄이면 가끔 통증 52
여전히 풀등 53
이 봄에 자목련 54
화분갈이 56
자작나무 숲에 들다―러시아 58
꽈배기 도넛 하나 60
봄 63
굴업도에서 하루 64
나에게 잠을 허하라 66
갱년기 혹은 68
어머니가, 없다 70
비가 내린다 71
대마도에 들던 날 72
어린 소녀와 강냉이 할아버지 74
제3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바이칼 77
달빛 걷기 78
사랑 타령 80
아름다운 날―결혼축시‧2 81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82
섬 83
수박을 먹다 84
오라, 꽃밭으로―결혼축시‧3 86
사월 오동도 88
거리論 90
마지막이란 언제나 슬픈 모르스부호다 91
내가 이별을 대하는 방식 92
배꼽을 위한 연가 94
저녁 스케치 96
낙엽독백 97
화랑대역 98
나는 바다를 듣는다 100
제4부 아마존을 듣는다
길105
아침 창가106
행복통신107
안개 혹은 기억의 집108
서포리 해변에 노을109
딸아이와 자전거110
골목 안 풍경112
오후 네 시 반 압구정 로데오 거리114
소리는 둥글다116
아마존을 듣는다118
빛은 각도를120
개심사에서122
우기123
곰소항 124
비상키126
귀가128
가을, 정취암129
해설/백인덕131
시간의 ‘뼈’ 사이—직립直立의 존재론
―소율의 시세계
4. 평문
소율 시인의 내 얼굴 위에 붉은 알러지는 시간의 뼈 사이에 대한 무의식적 천착穿鑿과 시적 성찰을 통한 존재 확인을 기도하고 있다. 작품에서는 중심 어휘로서, 즉 시집 전반을 일관하는 상징으로서 뼈가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필자의 독해는 사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사이는 시-공간 개념이다. 차이가 있다면 시간적 사이는 물리적으로 비가역적이지만, 공간의 사이는 언제든 변형 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어쨌든 사이는 경계이고 접경이고, 따라서 불안의 영역領域이고 위로의 지대地帶다. 사이(필자는 개인적으로 틈을 더 선호하지만)는 비록 무의식의 차원에서 언어의 표면을 뚫고 거칠게 솟구치지만, 그 거침과 투박함으로 인해 존재의 날raw 상황을 드러낸다. 교묘巧妙한 수법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는 시작詩作이 건져 올리는 생생한vivid 이미지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백인덕(시인)의 해설에서
5. 작품
물 위에 집을 짓다
숲을 연주하던 새들
서둘러 꽁지깃을 감추는군요
나무들도 더 이상은 햇살로 된 악보를 펴지 않아요
하늘은 아침부터 구름 낮게 흐르게 하고
무거워진 허리 비틀며 빗방울 후두둑 떨궈 놓네요
물기 젖은 내 몸속을 바람이 훑고 가네요
관절 마디마다에선 물안개가 피워 올라요
물 위에 뜬 내 집은
물살 한 번 일렁일 때마다 한 눈금씩 기울어가고
단단했던 둔덕 푸르르르 무너져 내려요
당신과 나의 사랑은
땅속에 끝끝내 뿌리내리지 못하는 물풀들처럼
흔들리다 흔들거리다
한 순간 휩쓸려가도 그만인 것을
눈물 한 방울의 무게에도 견딜 수 없는
파도
여보게 자네는 아나
시간이 흐를수록 각 진 어깨는 둥글려지고
거친 세상 한 귀퉁이가 무심히 잘려날수록
상처는 저 혼자서 어둠 속으로 드네
그 안에서 뿌리를 키워간다네
여보게
어둠은 이미 방향 잃고 헤매는 키를
되돌리지 못한다네
나는 이 때 세상 곳곳을 돌며
어찌 하나 어찌 하나 밤새 뒤채며 울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몸 어디쯤에 남아있을 멍자국들은
한겨울의 눈꽃처럼 화려한 꽃을 피우네
검푸른 실체를 드러낸다네
여보게, 자네 알고는 있나
여전히 혈기 등등한 바다
그 앞에서 굽은 등 꼿꼿이 펴고
앞으로만 향해서 내달리는 파도를 보며
부질없다 부질없다 참으로 부질없구나
그 이유를
여보게 자네는 아나
- 이전글꽃잎을 번역하다/송정현 시집 16.05.02
- 다음글원시적 에너지와 낭만의 방정식/김영덕 평론집 16.01.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