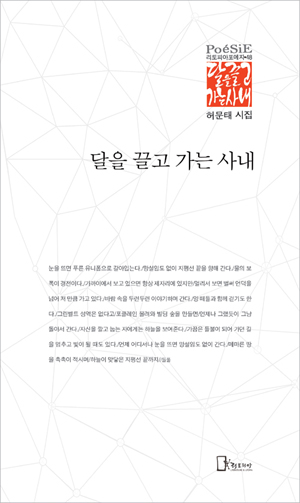발간도서
허문태 시집 '달을 끌고 가는 사내'
페이지 정보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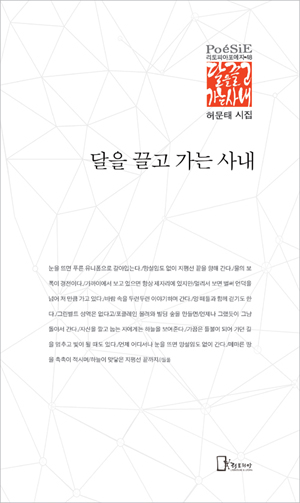

리토피아포에지?48
달을 끌고 가는 사내
인쇄 2016. 9. 5 발행 2016. 9. 10
지은이 허문태 펴낸이 정기옥
펴낸곳 리토피아
출판등록 2006. 6. 15. 제2006-12호
주소 402-814 인천 남구 경인로 77(숭의3동 120-1)
전화 032-883-5356 전송032-891-5356
홈페이지 www.litopia21.com 전자우편 litopia@hanmail.net
ISBN-978-89-6412-068-2 03810
값 9,000원
1. 저자
허문태 시인은 1970년대부터 동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으나 등단에 뜻을 두지 않다가 2014년 계간 리토피아로 뒤늦게 등단했다. 계간 아라문학 부주간이며 막비시동인으로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다.
2. 자서
시인의 말
뒤란에 고욤나무 한 그루 자랐다.
감나무가 되었다.
감꽃 같은 세상인 줄 알았는데
떫은 감이 열렸다.
떫은 것은 집요하게 폐쇄적이어서
몇 개의 땡감이 떨어졌다.
짙푸른 감이 팽팽하게 떫어졌을 때
얼핏,
떫은 것을 보았다.
떫다고 할 때 떫었다.
감들이 하나, 둘 등불을 켠다.
2016년 여름
허문태
3. 차례
제1부 들풀
들풀 15
잔설 16
이 아침에 18
새우 20
포클레인 22
반달 23
저 소나무 24
오후엔 갯벌을 생각한다 26
새싹 28
서리꽃 29
모래알 30
속리산俗離山 32
봄 34
공백기 35
감 36
초승달 37
동명아파트 907호,일출 38
강 40
고사목 42
제2부 찔레꽃
어느 대평원에서 45
찔레꽃 46
측백나무 길 47
다시 홍골못에서 48
이 지상에서는 50
문득, 수철이 생각 51
원수가 된 고구마 친구 52
나무는 54
절경 55
석양이 멋쩍다 56
넝쿨장미 57
산막이 옛길에서 58
불가마 60
언뜻 본 내 모습 62
낙엽 63
강화도江華道 64
꽃이 쳐다봐요 66
채송화 67
제3부 아라뱃길에서
아라뱃길에서?1 71
아라뱃길에서?2 72
아라뱃길에서?3 73
이슬 75
어머니의 허리 76
민들레 녹즙을 내다가 78
아버지 79
수수꽃 80
그릇이 깨질 때 내는 소리 81
개망초 82
진홍-마리아고로테 83
헬렌의 집에는 84
수녀님 말씀이 85
초보 농사꾼?1 86
초보 농사꾼?2 87
초보 농사꾼?3 88
초보 농사꾼?4 89
초보 농사꾼?5 90
제4부 달을 끌고 가는 사내
시장에서는 93
어둠으로 까는 바지락 94
푸른부전나비 한 쌍 96
봄 꽃놀이 97
달을 끌고 가는 사내 98
목포댁, 물빛 100
달 101
목련의 미소 102
빗소리 103
감의 곡선 104
수염 같은 106
채소전 단상 107
소문-건강원 cctv?1 110
불길-건강원 cctv?2 111
중년-건강원 cctv?3 112
자라목-건강원 cctv?4 113
헛소리-건강원 cctv?5 114
해설/고명철:어둠의 심연을 응시하며, 어둠을 껴안는 그리움
―허문태의 시세계 115
4. 평가
우리는 허문태 시인의 고목과 대평원으로 조율되는 시세계를 대하면서 깊이를 동반하는 어둠을 응시하고, 신생을 기다리는 어둠을 껴안는 시적 행위를 음미해보았다. 이러한 허문태의 시작詩作이 시적 주체뿐만 아니라 타자를 함께 치유하는 것이면서 자연스레 허문태의 미의식을 생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상 속으로 파고든 성스러운 시적 성찰이야말로 허문태 시세계의 매혹을 드러낸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시에서 타전되는 시적 전언과 시적 성찰을 삶의 구체적 실감으로 포착하는 데 낯설지 않다. 그래서일까. 버스 정류장에서 붕어빵 굽는 여자가 머금은 알 수 없는 미소에 수반되는 숱한 이유들을 헤아릴 수 있다./고명철(문학평론가)의 해설에서
5. 작품
들풀
눈을 뜨면 푸른 유니폼으로 갈아입는다.
망설임도 없이 지평선 끝을 향해 간다.
물의 보폭이 경전이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으면 항상 제자리에 있지만
멀리서 보면 벌써 언덕을 넘어 저 만큼 가고 있다.
바람 속을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간다.
양 떼들과 함께 걷기도 한다.
그린벨트 성역은 없다고
포클레인 몰려와 빌딩 숲을 만들면
언제나 그랬듯이 그냥 돌아서 간다.
자신을 깔고 눕는 자에게는 하늘을 보여준다.
가끔은 들불이 되어 가던 길을 멈추고 빛이 될 때도 있다.
언제 어디서나 눈을 뜨면 망설임도 없이 간다.
메마른 땅을 촉촉이 적시며
하늘이 맞닿은 지평선 끝까지
잔설
대섬 외진 뒤쪽에 언뜻
낮달이 흐른다.
서글한 눈매에
성긴 백발
어머니는 여전히 무고하시다.
저녁 시린 어스름
포구의 이마에
닻을 내린다.
얼어붙은 북극성
그 외로운 천 년 고도까지
심지를 돋우고
가물가물 호롱불이
돌아오는 시간
대섬이
잠시 기우뚱 흔들린다.
물거품이
혼백처럼 하얗게 부서진다.
이 아침에
눈을 뜨니 그들이 먼저 와 있다.
아파트 창가에 몸을 낮춘 베고니아
꽃들은 자기 안에 남은 어둠을 마저
털어내고 있다.
뒷머리가 깐쫑한 물새 몇 마리
간밤 알 수 없는 산야에서 빛을 모아
다시 여민 영혼의 강 한가운데
포로롱 날아오른다.
이 봄의 문턱까지 흐트러짐 없이 걸어온 시계들
이제 막
옹알이를 시작한 첫애의 눈빛처럼
초침소리가 맑게 울린다.
자작나무의 먼 숲을 그린다.
들녘이,
산맥이 달려오고
또 한 도시가 서서히 일어서고
오늘은 그대 초연히 풀린 강을 건너고 싶다.
그 강가에 낮게 몸 부비는 풀잎들이
안개 속에서
닻 올리는 소리
이제 베고니아의 윤기 진 이파리에 아침햇살이
둥글게 굴러 내린다.
새우
9월 초승달이
알곡처럼 속살이 여물 때쯤
휜 허리 마디마디
외할머니는 괴질을 앓는다.
그 황혼 한 자락에 손을 넣으면
내장이 비쳐드는 아린 알몸에
오한처럼 서걱이는
한 줌 소금기
높새는 밤새 처마 끝에 울고
그 청상의 아련한 불빛 사이
톡톡 튀어 오르는
어린 손자들의 은빛
비늘들
한평생 촉촉이 베틀에 앉아
한없이 부드럽고
깨끗한 천을 짜는 그 눈의
긴 촉수
한갓 목숨쯤이야
있는 듯 없는 듯
뜰 아래 흰 고무신 한 켤레
새벽녘까지 허옇게 모시를 삼다
뿔테 고운 돋보기를 벗어놓고
윤기 좌르르
이때 한 번 외할머니는 허리를 펴신다.
포클레인
모든 무너지는 것에는 사이렌 소리가 난다 허리 부분이 앙상히 잘린 도로 확장 공사장 빈 터, 달빛이 은은히 떨어지고 있다 벽돌들의 잔해 속에서 월셋방 벽보가 지느러미를 파닥인다 그 수없이 드나들던 산동네 골목길, 다시 언뜻 가겟집의 백열등이 눈앞에 흔들리다 사라진다
아직도 나팔꽃은 낮은 담장을 기어오른다
거기 통장네 집 손바닥만 한 창문 앞까지, 거인처럼 포클레인이 무기질의 근육을 완강히 감추고 눌러 서 있다 외등 둘레로 왁자지껄 한파가 깔린다 귀 기울이면, 나팔꽃 속에서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지금쯤 어느 강을 건너고 있을까
퍼런 집념의 삽날들 사이로 물고기의 비늘처럼 달빛이 떨어진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또 소박한 가슴들을 얼마나 무너뜨렸는가 무너지는 것에는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어쩌면 차라리 그것이 힘인지도 모른다 신호등에 걸려 있는 저 천진한 눈빛들
반달
콩알 반쪽 같은 몸뚱이로
가파른 능선을 넘고 있었다.
술이 하 취해서
딱 한 번 넘어졌다.
달은
혼자서 제 그림자를 지우고 있었다.
엉덩이를 털고 다시 일어서는 산
공연히 서러웠다.
마음은 이미
큰 우물집 토담 위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 이전글김용균 시집 '능수벚꽃 아래서' 16.09.16
- 다음글권순 시집 '사과밭에서 그가 온다' 16.06.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