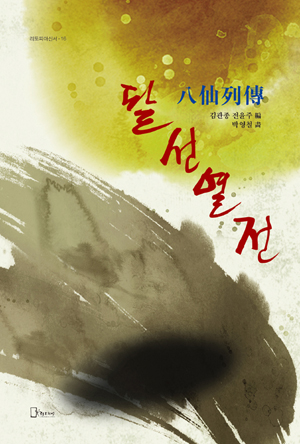발간도서
팔선열전/김관종 전윤주 편(리토피아신서16)
페이지 정보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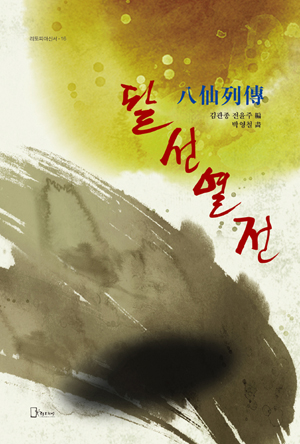
리토피아신서?16
팔선열전
초판 1쇄?인쇄일 2015. 7. 1. 발행일?2015. 7. 6.
엮은이?김관종 전윤주 그린이?박영철 펴낸이?정기옥 펴낸곳?리토피아
주 소?402-013 인천 남구 경인로 77
전 화?032-883-5356 F.032-891-5356
전자우편?litopia@hanmail.net 홈페이지?www.litopia21.com
등록일?2006년 6월 15일 제2006-12호
ISBN 978-89-6412-49-1 03810
값 12,000원
1 편자
김병각金秉珏 1956년 11월 경북 금릉군金陵郡(김천시)조마·삼산助馬·三山 출신, 호號는 관종寬宗 또는 일륜一輪, 대학교 졸업, 북경 사회과학원 유학, 공직 30년 근무 후 퇴직, 유불선 공부를 거쳐 현재 법륜대법法輪大法(파룬궁) 수련 중.
전윤주 부경대학교 재료공학과 졸. 동아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 졸.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휴학.
2. 자서
팔선전八仙傳을 펴내면서
팔선八仙은 중국을 대표하는 여덟 명의 신선으로서 신선전이나 중국민간설화 등에 수많은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 삼국에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다.
수많은 신선들 중 이들 팔선은 동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나 시간차를 두고 당나라와 송나라를 거치면서 종리권 ·여동빈·조국구 등 여덟 명으로 압축되어 지금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번에 팔선八仙을 하나로 묶어 팔선전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팔선의 출생비화, 수도과정, 명리색기名利色氣를 초개같이 버린 신통자재하고 표일한 삶, 시공을 초월한 기행 등을 모았다. 책 내용은 ‘신선전’이나 ‘팔선득도전’ 등 여러 자료에서 모은 것으로 편저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기술한 것述而不作임을 미리 밝혀둔다.
무릇 득도한 신선과 진인은 소요자재逍遙自在하고 청정무위淸靜無爲하다. 이러한 자재하고 청정한 삶을 동경하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산유곡이나 도관 또는 시정에서 신선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
이 책은 도가나 신선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불교 및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수련과정의 참고 자료로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 일반인들이 옛날 신화나 이야기 거리로 읽어도 재미가 있고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찍이 팔선의 한 분인 여동빈은 말씀하셨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도 밝히기도 어려워라, 이 사람의 마음을 빌어서 도의 뿌리를 찾는다.人身難得道難明, ?此人心訪道根 이 몸을 이 생애에 제도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하리오.此身不向今生道, 再等何時度此身” 수많은 인간들이 속세의 명리에 빠져 일생을 허우적거리다가 헛되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 시를 남겨 후학을 경계하였다. 학도學道하는 자들은 금생에 반드시 득도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름지기 수련에 힘써야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수련修煉한다고 하여 명공命功인 연마煉磨에만 주로 힘쓰고, 닦는다는 수修를 다소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필자의 생각은 사실 닦는다는 수修는 연마의 수식어가 아니고 심성수련 · 마음수련으로서 성공性功인 바 심성수련이 제대로 되어야 진정한 성명쌍수性命雙修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수련자는 모름지기 마음(심성)수련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겠다.
이 책이 나오기 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많았다. 리토피아 출판사 관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오래 전 ‘대기원시보’에 팔선전이 연재될 당시 매회 삽화를 정성껏 그려주신 박영철 화백님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
또 공편자인 전윤주 학인은 지난해 계룡산 대자암에서 만났다. 이 땅에 도가 및 도교 경전의 총결인 도장道藏을 번역하여 세상에 내놓겠다는 큰 서원이 있는 자로서 이 ‘팔선전’과 ‘열선소전’을 출간할 때 공편자로 이름을 올리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기에 기꺼이 응하게 되었다. 아무튼 이번 책을 출판하는데 있어 동분서주한 그 노고가 다대하였다.
2015년 3월
김병각
3. 차례
팔선전八仙傳을 펴내면서 5
인사말 8
들어가면서/팔선八仙은 13
1仙/황룡선사와 법력을 겨룬 여동빈呂洞賓 15
2仙/장생불로술을 터득한 장과로張果老 42
3仙/육체를 빼앗겨 거지가 된 철괴리鐵拐李 62
4仙/동굴에 선도비결 남기고 사라진 종리권鍾離權 75
5仙/여성 수련에 관심 가진 하선고何仙姑 86
6仙/답답가 부르다 선학 타고 사라진 남채화藍采和 94
7仙/천상의 술과 꽃을 즉석에서 만든 한상자韓湘子 100
8仙/옥황상제를 알현한 조국구曺國舅 120
後記/八仙 내력 126
4.본문
들어가면서
팔선八仙은
팔선은 중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기행奇行과 속세를 초월한 것으로 알려진 8명의 신선이다. 이들 팔선은 종리권ㆍ장과로ㆍ이철괴ㆍ한상자ㆍ여동빈ㆍ조국구ㆍ남채화ㆍ하선고女神仙를 말한다. 민간에서 유행하는 팔선도 그림의 좌측에서부터 조국구曺國舅는 송나라 조황후의 아우로서 신선이 되어 운양판雲陽板을 가지고 있으며, 종리권鍾離權은 한나라 때 사람으로 부채를 가지고 있다. 한상자韓湘子는 한상의 존칭이고 당나라 때 인물로서 유명한 유학자이며 문장가인 한유의 조카인데 피리를 불고 있다. 한상자 그림 뒤에 있는 여동빈呂洞賓도 당나라 때 사람으로 등에 칼을 차고 손에는 불자佛子를 들고 있다. 유일한 여자 신선인 하선고何仙姑는 이름이 경瓊이며 당나라 때 사람으로 연꽃을 들고 있다.
그리고 남채화藍采和도 당나라 사람으로 청년의 모습을 하고 꽃바구니를 들고 있으며, 장과로張果老는 장과의 존칭으로 당나라 때 사람이며 나귀를 거꾸로 타고 어고와 간판을 가지고 있다. 이철괴李鐵拐는 절름발이로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표주박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팔선도
이들 팔선은 개별적으로 당나라와 송나라 문헌에 나타나다가 원나라 때부터 팔선으로 정리된 듯하며 중국의 소설, 희곡, 회화, 건축 등 여러 분야의 주제가 되어 왔다. 또한 민간에 널리 유전되어 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여기서는 이들 팔선의 출생비화, 수도과정, 부명재색富名財色을 초월한 행위, 신통 자재한 인생항로, 시공을 초월한 기행奇行을 살펴보겠다. 제 일화는 고금에 널리 알려진 여동빈의 이야기이다.
1仙
황룡선사와 법력을 겨룬
여동빈呂洞賓
여동빈 악양루에 오르다
신선 여동빈의 일화에 앞서 그의 호쾌함이 돋보이는 당시 한 수가 있다. 당나라 시대, 어느 날 동정호에 달이 휘영청 뜬 밤, 여동빈이 홀로 악양루에 올라 시를 읊었다.
자영自詠
스스로 읊노라
獨上高樓望八都 독상고루망팔도
墨雲散盡月輪孤 묵운산진월륜고
茫茫宇宙人無數 망망우주인무수
幾個男兒是丈夫 기개남아시장부
홀로 높은 누각에 올라 팔방을 바라보니,
검은 구름 흩어지고 둥근 달만 중천에 외롭게 떠있다.
망망한 우주에 사람은 많고도 많은데,
사내대장부라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시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한한 우주공간까지 이어지는 기개를 느끼게 하는 통쾌한 작품이다. 여동빈은 당唐시대의 대표적인 도사이며 민간에서는 팔선의 하나로 인구에 회자되었다. 도사 여동빈이 활약하던 그 당시는 황소黃巢의 난으로 세상이 뒤숭숭할 때였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시에서 여동빈이 황소의 난을 평정할 사람 하나 없는 현실을 탄식한 것으로도 해석한다.
여동빈이야말로 팔선 중에서 전해오는 일화와 사적이 가장 많다.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개가 여동빈을 보고 짖다니, 좋은 사람을 몰라본다狗咬呂洞濱, 不識好人心”라는 것이 있다. 그 정도로 여동빈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여동빈 성명 석자는 세간을 두루 돌면서 중생을 구도한 신선의 대표적 명칭이 되었다.
출생일화
여동빈의 본명은 경(瓊)이고, 자字는 백옥伯玉이며 또 다른 이름은 소선紹先이다. 출가 이후에는 이름을 암岩으로 고쳤고, 자는 동빈洞賓이다. 그는 당나라 후대, 관서 하중부 낙현 사람이다. 현재 지명은 산서성 영락현이며, 그곳에 그가 태어난 것을 기념해서 만수궁萬壽宮을 세웠다. 그는 당나라 덕종 정원貞元 12년(797년) 4월 14일에 출생했다고 한다. 그의 모친이 여동빈을 낳을 때 기이한 향기가 방에 가득하고 자주색 구름이 하늘을 덮었으며 한 마리 선학仙鶴이 하늘에서 날아 내려와 침상으로 날아들다가 돌연 사라졌다고 한다.
마조 도일馬祖道一의 미래 예견
여동빈은 태어나면서부터 관상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고 한다. 즉 양쪽 눈썹이 길고 비스듬히 구레나룻과 이어졌고, 봉황의 눈매에 광채가 나며, 코는 높고 단정하며 왼쪽 눈썹과 왼쪽 눈 아래 검은 점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부친은 이렇게 기이한 조짐을 갖고 태어난 이 아이를 매우 총애하였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교롭게도 불교 선종 6조 혜능대사의 손孫제자인 마조화상이 그의 집을 방문했다. 동빈의 부친은 강보에 싸인 아이를 안고 와서 마조대사에게 보이면서 아이의 앞날을 물었다. 마조대사가 동빈의 운명을 점쳐본 후, “이 아이는 풍모가 맑고 기이하며, 골상 또한 평범하지 않으니, 풍진을 벗어난 뛰어난 인물이다. 아이가 성장한 후 우여즉거遇廬則居(여를 만나면 머물고)하고, 우종즉고遇鍾則叩(종을 만나면 두드려라)하라. 이 여덟 자를 평생 꼭 기억하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한다. 나중에 마조대사가 예언한 그 여덟 자의 의미처럼 동빈은 과연 여산廬山에서 수행하였고, 종리권鍾籬權을 만나 도를 배웠다고 한다.
*마조 도일馬祖 道一 : 당나라때 승려로 750년 전후로 활약하였으며 속성은 마馬 씨, 통칭 마조도일, 사천성 출신으로 19세 때 출가하여 선종 6조 혜능 문하의 남악 회양南岳懷讓의 법을 이었다. 강서성 홍주를 중심으로 교화하였기 때문에 그 일파를 홍주종洪州宗이라고도 한다. 널리 알려진 문하생이 백장, 대매, 남천 등이며 남악의 종풍이 일시에 융성하였으며, 후일 임제종臨濟宗으로 발전하였다. 마조 천하라 하여 마조의 선풍이 온 세상을 덮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선禪을 실천하는 새로운 선종이 이 무렵 시작되었다고 한다.
여동빈의 젊은 시절, 두 차례 과거시험 낙방
여동빈은 어린 시절에 총명이 남달라 하루에 글자 만 자를 암송하고 말이 입에서 나오면 문장이 되었다고 한다. 성장한 후 신장은 8척 2촌에 목덜미는 기다랗고 이마는 넓었으며, 봉(황)의 눈과 광채가 나는 눈썹에 행동거지는 당당했다고 한다.
성격은 소박하였으나 말주변이 없었으며, 언사가 능숙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성년이 되어 김씨를 아내로 맞아 자녀 넷을 두었다. 당나라 무종(회창) 연간에 여동빈은 두 차례나 장안에 가서 과거를 보았으나 두 번 다 낙방하였다고 한다.
장안 술집에서 선인 종리권을 만남
여동빈이 두 번째로 장안에 가서 과거에 응시하였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46세였다. 과거에 낙방하고 낙심하여 가슴속에 쌓인 울적한 그 심정은 보지 않아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울적한 마음을 풀기 위해 발길이 가는대로 걷다가 어느 작은 술집에 들어갔다. 자작하면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심정은 마치 바람 따라 거리를 떠도는 가을 낙엽처럼 의지할 바 없이 쓸쓸하였다.
바로 이 때 술집으로 긴 수염에 빼어난 눈썹, 안색이 붉으레하게 빛나는 도사 복장의 한 노인이 걸어 들어와 여동빈의 맞은 편 빈자리에 앉았다. 세간의 다툼이 없는 듯 사리사욕이 없고, 온화함이 넘치는 듯한 그 노인의 풍모는 여동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마주하여 술잔을 권하면서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선인 종리권 즉석에서 시를 짓다
술잔을 돌리면서 서로의 심사를 한마디씩 토로한 후, 풍채 좋은 노인은 돌연 시심이 크게 일어난 듯 술집 종업원을 불러 붓과 먹을 가져오게 하였다. 노인은 즉석에서 시를 읊으면서 붓을 들어 술집 벽 위에 다음과 같이 써내려 갔다.
坐臥常携酒一壺 좌와상휴주일호
不敎雙眼識皇都 불교쌍안식황도
乾坤許大無名姓 건곤허대무명성
疏散人間一丈夫 소산인간일장부
앉으나 누우나 언제나 한 호로의 술을 가지고 다녔고
두 눈으로는 황도(세상일)의 일을 모르도록 했다네
하늘과 땅은 이렇게 큰데 성도 이름도 없이
한낱 인간세상을 떠도는 한 사내일 뿐일세.
여동빈은 시를 음미해 보고는 노인의 시풍이 표일하고 호방함을 깊이 찬탄하였다. 여동빈은 두 손을 맞잡고 가슴까지 올려 절을 하고난 후 노인에게 물었다. “비록 하늘과 땅이 이렇게 큰데 성도 이름도 없다고 하였지만, 후배인 저로서는 도장께서도 칭호가 있을 것 같아 묻자옵니다. 도장의 성명 삼자를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은 두 눈에 미소를 띠면서 “나의 성은 종리鍾離이고 이름은 권權이요.”라고 하였다. 여동빈은 ‘종리鍾離’ 두 글자를 듣자, 마음속에 마치 종이 울리듯 옛날 부모님이 늘 말씀하셨던 ‘마조馬祖선사의 예언’이 떠올랐다. 즉 “우여즉거遇廬則居하고 우종즉고遇鍾則叩하라.”(廬를 만나면 머물고, 鍾을 만나면 두드려라) 문 앞에 앉은 이 기이한 노인이 내가 마땅히 두드려야 하는 종鍾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여동빈, 선인 종리권에게 詩로 화답하다
여동빈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예언이 적중하는 상황을 만나자 순간 멍하였다. 이때 종리 노인이 술잔을 들며 “자, 우리 술 한 잔 합시다.” 하면서 술을 권한다. 술을 마신 후 종리 노인은 “자네도 시 한 수 짓는 게 어떠한가?” 하였다. 여동빈도 술 한 잔을 마시자 시심이 샘솟듯 올라와 붓을 들고 술집 벽 위에 일필휘지로 써내려갔다.
生在儒家遇太平 생재유가우태평
懸纓垂帶布衣輕 현영수대포의경
誰能世上爭名利 수능세상쟁명리
欲侍玉皇歸上淸 욕시옥황귀상청
유가 집안에 태어나 태평시대를 만났건만
갓 끈을 걸어두고 허리띠를 벗어 놓았으니 삼베옷이 가볍다(벼슬하지 않은 포의를 비유)
누가 세상과 더불어 명예와 이익을 다투겠는가?
옥황상제를 모시러 상청경으로 되돌아갈까 한다.
종리권은 여동빈의 시를 한참 물끄러미 쳐다본 후 크게 기뻐하면서 “공자는 이미 도를 향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를 따라 세상을 버리고 입산하지 않겠소?” 하였다. 여동빈은 머리를 흔들며 다만 집안에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고는 아무래도 속세를 떠나기가 어려운 듯이 말하였다.
종리권은 여동빈을 한 번 척 보고는 그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본 듯이 몸을 일으키면서 “그대와 나는 곧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 지금은 우선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내일 당신은 여기 적혀있는 이 여관의 주소로 나를 찾아오라.”고 말하고는 먼저 자리를 떴다.
- 이전글바람평설/우동식 시집 15.07.16
- 다음글산골연가/최정 시집(리토피아시인선 15.03.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