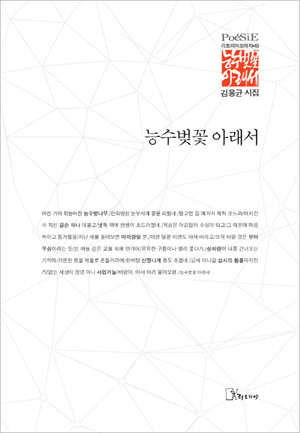공지사항
김용균 시집 '능수벚꽃 아래서'(리토피아포에지49) 출간
페이지 정보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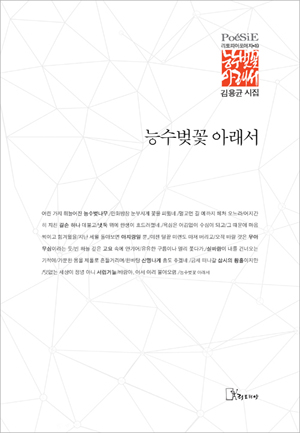
리토피아포에지?49
능수벚꽃 아래서
인쇄 2016. 9. 5 발행 2016. 9. 10
지은이 김용균 펴낸이 정기옥
펴낸곳 리토피아
출판등록 2006. 6. 15. 제2006-12호
주소 402-013 인천 남구 경인로77(2층)
전화 032-883-5356 전송032-891-5356
홈페이지 www.litopia21.com 전자우편 litopia@hanmail.net
ISBN-978-89-6412-069-9 03810
값 10,000원
1. 저자
김용균金龍均 시인은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남성중·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공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줄곧 판사로서 한길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을 끝으로 30여 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지금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불우한 이웃들을 상대로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펼치는 봉사단체인 <연탄은행>의 홍보대사로도 활동해오고 있다. 호는 여산如山이고, 저서로는 ‘숲길에서 부친 편지’(서간집), ‘소중한 인연’(독서노트), ‘낙타의 눈’(시집) 등이 있다.
2.자서
시인의 말
시詩는 말(言)이로되, 기도하고 수행하는 절(寺)안에서 하는 말과 같으니, 시를 짓는 생각에 삿됨이 있을 리 없다.
사무사思無邪, 삿된 생각을 조금이나마 씻어내자는 바람으로 지어온 시들을, 굳이 다른 이에게 내보이고 싶은 생각 또한 씻어내야 하리라.
단지 내 부끄러움을 보여주어야 다른 이와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동안 새로 지은 108수의 시들을 한데 묶어 당신께 감히 보여드리지만,
백팔번뇌百八煩惱, 그 위에 번뇌 하나 더 얹고 말았다.
2016년 8월
김용균
3. 차례
제1부 춘곤春困
능수벚꽃 아래서 15
영춘화迎春花 16
꽃 이름 18
춘곤春困 19
봄앓이 20
양심에 대하여 22
어느 오후 산책 23
나숭개 국 24
민들레 꽃씨 25
목어木魚 26
어느 노송老松의 독백 28
질경이 30
아니? 31
검은등뻐꾸기 32
문향聞香 34
꽃들이 고운 까닭 35
장맛비 속에서 36
장다리꽃을 보며 38
친구를 문병하고 40
달팽이의 꿈 41
개망초꽃 42
단장斷腸 44
자존감에 대하여 46
푸념 타령 48
행복이란 49
채송화 씨앗 때문에 50
벌새 한 마리 52
제2부 단풍 단상
고요에 홀려 55
단풍을 보며 56
연어의 귀환 57
막핀꽃 58
단풍 단상 60
억새 62
어느 달밤 63
가을을 찬미함 64
숲속에서 65
옹달샘 66
낮달 67
어느 빈소에서 68
꽃들은 피고지고 70
어느 해질녘 71
부러운 놈 72
어떤 선물 73
영혼에 대하여 74
무소의 뿔처럼 75
일출 기도 76
다람쥐 78
교도소 앞에서 80
집 81
나의 시詩, 그리고 82
눈을 맞으며 84
백사마을에서 86
명태 이야기 87
사랑의 약속 90
제3부 어머니 추억
아버지 사진 옆에서 95
필담筆談 96
어머니 추억 98
주례 본 날 100
나는, 102
거시기 104
어머니의 치매 106
옌벤 할머니 108
누님의 된장 109
혼서지를 쓰며 110
내 것이 좋다 112
아들에게 114
어머니의 아리랑 116
함께 있음에 118
농부의 새벽길 119
내 친구 동연이 120
송파 세 모녀 122
이별 124
친구여, 남녘으로 가세나 125
가없는 사랑 128
당신 129
우리 목사님 130
두 농군 131
같은 하늘 아래 132
정류장에서 134
성남 인력시장에서 136보고 싶어요 138
제4부 동백의 꿈
사랑의 이치 141
동백 옆에서 142
동백단상 143
꽃과 새의 대화 144
동백과 바람 146
동백 숲에서 147
동백의 꿈 148
동백꽃 사랑 150
늙음에 대하여 151
문경 새재 길 152
설악雪岳 해변에서 154
건봉사乾鳳寺 소나무 155
세화리 해변에서 156
또 하나의 천지天池 157변시지邊時志 그림 앞에서 158
동막 갯벌에서 159
가는귀 160
백담사百潭寺에서 162금강 소나무 숲길에서 164
제라늄 레드 165
매미의 허물을 보며 166실상사實相寺에서 167
알아야 면장? 168
가족 169
물로써 살다 170
제주 곶자왈에서 171도둑고양이 엿보기 173
해설/허형만:세상을 품은 따뜻함과 넉넉함 175
―김용균의 시세계
4. 평가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품어 안는 방법은 다양하다. 특히 김용균 시인의 이번 두 번째 시집 능수벚꽃 아래서에서 보여주는 시세계는 어쩌면 그리도 따뜻하고 넉넉한지 모르겠다.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시는 말이로되, 기도하고 수행하는 절 안에서 짓는 말과 같으니, 시를 짓는 생각에 삿됨이 있을 리 없다. 사무사思無邪, 삿된 생각을 조금이나마 씻어내자는 바람으로 지어온 시들”이라고 고백한다. 그만큼 시인의 삶이나 정신세계가 하늘의 뜻과 합치되는 신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나는 방금 ‘신비’라고 했다. 왜 그 말이 불쑥 떠올랐을까. 그건 성경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리고, 바오로의 코린토 말씀에서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주니,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존속하리라.”는 말씀을 김용균 시인의 시 속에서 체득할 수 있었던 덕분이지 않을까. 나는 김용균 시인과는 안면이 없다. 그럼에도 시가 말한다. 시인의 따뜻함과 넉넉함과 사랑의 정신을./ 허형만(시인, 목포대 명예교수)
5. 작품
능수벚꽃 아래서
여린 가지 휘늘어진 능수벚나무,
만화방창 눈부시게 꽃을 피웠네.
멀고먼 길 예까지 헤쳐 오느라
어지간히 지친 길손 하나 데불고
냇둑 위에 한생이 흐드러졌네.
욕심은 어김없이 수심이 되고
그 때문에 마음 썩이고 힘겨웠을
지난 세월 돌아보면 아지랑일 뿐,
이젠 털끝 미련도 마저 버리고
오직 바랄 것은 무아무심이라는 듯
빈 하늘 깊은 고요 속에 안기어
유유한 구름이나 멀리 쫓다가,
실바람이 내를 건너오는 기척에
가뿐한 몸을 제풀로 흔들거리며
한바탕 신명나게 춤도 추겠네.
금세 떠나갈 삽시의 황홀이지만
덧없는 세상이 정녕 아니 서럽거늘
바람아, 어서 이리 불어오렴.
영춘화迎春花
그대여, 봄이 오고 있네요
귀 익은 새 울음소리 들리더니
섭섭히 헤진 꽃자리마다
반가운 꽃들이 다투어 피네요
해전보다 훨씬 곱고 실한
꽃망울을 터트린 것은
한 시도 어기지 않은 정직을
하늘이 축복함일 테고요
가냘픈 개화開花가
더 우람찬 하늘을 떠받치니
세상엔 살아갈 기적들이 지천이네요
한갓되이 떠나는 것뿐인
쓸쓸하고 휘휘한 날들이야
그마저 떠나보내면 그뿐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산자락에
힘겹게 피어난 영춘화 한 떨기를
빈 가슴으로 쓸어안으면
어스름히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도
한 점 고요를 결실할까요
얼근한 꽃샘바람이 또 불 테지만
어디라고 감히 탐하겠어요
그대여, 봄을 맞으세요
꽃 이름
이 세상엔
하찮은 목숨이란 것들이
얼마나 더 곱게 빛나는 줄 알라고,
개불알꽃, 며느리밑씻개, 거지덩굴, 노루오줌, 애기똥풀,
중대가리나무, 큰도둑놈의갈고리, 소경불알, 미치광이풀,
뚱딴지, 말오줌나무, 며느리배꼽, 여우오줌, 쥐똥나무,
쥐오줌풀, 광릉요강꽃, 누린내풀……
누추한 이름이라 흉보지 말고
허울 좋은 제 이름이나 부끄러운 줄 알라고,
춘곤春困
민들레 홀씨 하나
나풀대는 아지랑이 춤에 마음 들떠
마실가는 길
산기슭 양지바른 길목에
남새 몇 잎 늘어놓고 앉은
등 굽은 호호백발 위로
살포시 내려앉는다
떼 지어 지나는 군소리는커녕
억센 우김질까지도 끄떡없더니
봄동값을 묻는 기척에 움칫 하였다간
이내 홀씨는 너울너울
복사꽃 향기를 따라나서고
바람 같은 노구만 혼자남아
숫제 고부라지고 마는
봄마중 꿈길
봄앓이
산마루에 호젓이 앉아
지나는 수심을 붙들어 세운
왕벚나무에 무엇이 우거졌나요?
철모르는 새들이야
제멋대로 수런거리지만,
무성한 꽃들이 가리키는 건
아예 안 그런 척 치장하고
차라리 침묵해야 더 좋았을,
흐드러진 봄볕에 오가리 되어
금세 꽃가루처럼 쏟아질 듯한
내 혈기 떠난 말들이었지요.
꽃그늘 위를 맴돌다가
야윈 나뭇가지 끝으로
무슨 유혹이 또 걸려 있나요?
산비탈을 내려오다 말고
휑한 발길을 뒤돌려보니,
해쓱한 낮달 속에 비추인 건
새싹들이 언 땅을 간질이고
실바람에 성긴 별이 깜박이듯,
시를 쓰며 애태운 지난 봄밤에
끝내 내게로 오지 않은
그 말 한 마디였지요.
양심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양심을 외치던 시절,
합숙소에서 새우잠을 붙인 한 소년가장이
샛별도 밝기 전에 서울대병원으로 뛰어가
화장실 수돗물을 벌컥벌컥 들이켠 뒤
팔뚝 피를 뽑았는데,
물 섞인 피를 파는 게 못내 걸리긴 해도
한 푼 더 챙긴 핏값으로 가족끼니를 에운다면
술에 물 타고 소도 물 먹여 판다는데
양심을 가책하진 말자고 애써 달래며
회복실에 누웠는데,
허기 채운 동생들의 아린 웃음을 떠올리고
혈관에서 흐른 피를 찍어낸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하나 또 벽에다 그려놓으니
안도했던 가슴속에 추상같이 피어나는
고향의 동백꽃은 붉기도 한데,
* 신영복님의 ‘담론’에 실린 감옥생활 이야기 중에서 인용함.
어느 오후 산책
길은 언제나 그치지 않는 유혹,
고삐 풀린 짐승처럼 문밖을 나서자마자
나 혼자 길 위에서 들썽거렸다.
이름 모를 꽃들이 떨기떨기 모여 앉은
길찬 숲을 헤치고
바람 향기 아슴아슴한 언덕을
사푼사푼 걸어 돌아
고요의 정령들이 머물다 간 냇가에서
물 위에 뜬 꽃잎을 세고 있다가,
너럭바위가 내준 옴팡한 자리를 빌려
호접몽胡蝶夢을 꾸었다.
새들이 요란하게 우짖거나 말거나,
대붕大鵬이 날아간 서녘 하늘 멀리로
석양이 마냥 불붙고 있을 즈음,
숨가쁜 목소리로 누군가 부르거들랑
재 너머 복삿골로 꽃구경 갔노라고,
어느새 나도 그를 잊었노라고,
나숭개* 국
어무니, 이 국 밍밍해서 싫어.
어쩌끄나, 우리 아덜이 이 좋은 맛을 언지 알꺼나.
이냥 그걸 모른 채 나는,
거친 끼닛거리에 길들고 나면
그런 헤식은 푸새 맛조차
입에 감치게 되는 것이라고
적당히 철들었는데,
너울대는 아지랑이 춤사위 따라
종다리들 졸졸 데리고
꼬불꼬불 언덕길을 훌쩍 넘어가신
어무니 노래에 목이 메고서야,
버릇처럼 다시 몸살을 앓는
쇠잔한 이른 봄의 밥상머리에서
나 홀로 언뜻 마음이 홀려지는
나숭개 국 한 그릇.
* ‘냉이’의 전라도 방언.
- 이전글정령 시집 '크크라는 갑'(리토피아포에지 45) 출판기념회 성료 16.10.10
- 다음글허문태 시집 '달을 끌고 가는 사내'(리토피아포에지48) 출간 16.09.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