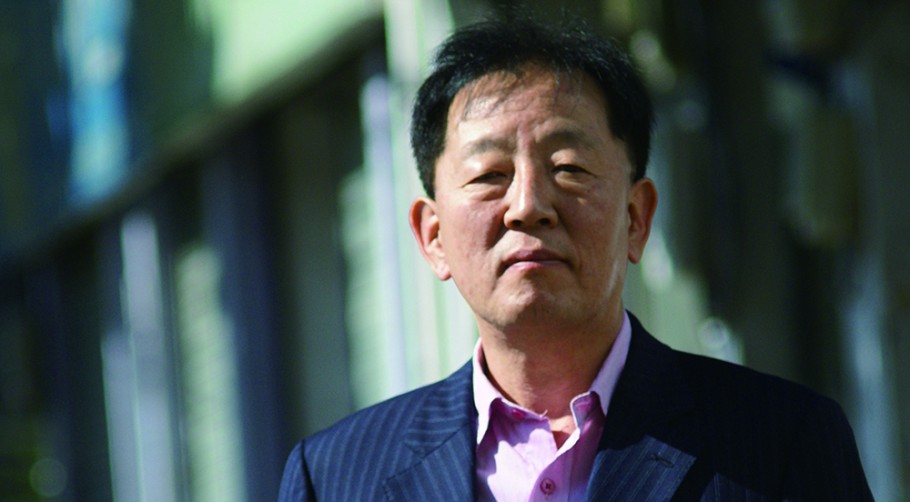공지사항
손제섭 시집 '새 잎'(리토피아포에지108) 발간
페이지 정보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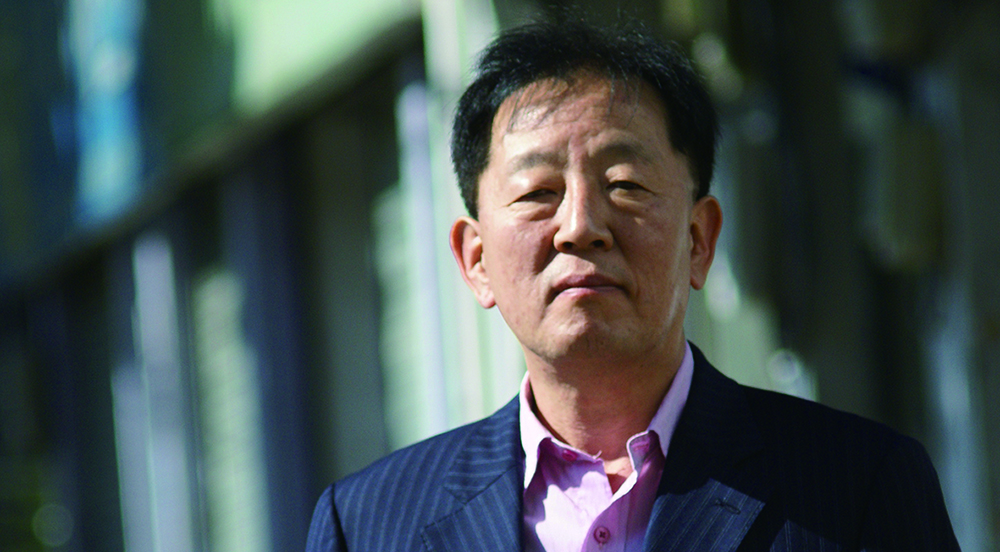

리토피아포에지․109
새잎
인쇄 2020. 10. 20 발행 2020. 10. 25
지은이 손제섭 펴낸이 정기옥
펴낸곳 리토피아
출판등록 2006. 6. 15. 제2006-12호
주소 22162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77
전화 032-883-5356 전송032-891-5356
홈페이지 www.litopia21.com 전자우편 litopia@hanmail.net
ISBN-978-89-6412-138-2 03810
값 10,000원
1. 저자
손제섭 시인은 1960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2001년 ≪문학과의식≫으로 등단하여 시집으로 2002년 그 먼 길 어디쯤, 2010년 오 벼락같은을 출간했다.
2. 자서
시인의 말
돌고 돌아 육십갑자六十甲子를 맞아 세번째 시집을 낸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제목을 ‘새잎’이라 붙인다.
십년만에 지어 보태는 문장文章이지만 분간分揀할 수도 분별分別할 수도 없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지난날은 경이驚異로웠다.
그 경이驚異에 경의敬意를 표하고 나니 그저 무덤덤해진다.
내일 혹 뼈아픈 감동感動이 찾아온다 해도 오늘은 그 무덤덤함을 찬탄讚嘆한다.
덧붙이자면 이 시집이 나옴으로 육십 내내 본정말정本正末淨이라 믿고 따라온 삶이 훼손毁損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20년 9월
손제섭
3. 목차
제1부
몽산포 타령 15
이름 모를 별 16
정情―아우 복도에게 18
그 집 20
이별의 품사 21
장마 22
화무십일홍 23
실상사·2 24
논물 대기 14
돼지부속을 먹으며―현석 아우에게 28
여수 밤바다 30
법주사 보리수나무 32
여수旅愁 34
새잎 36
오래된 이름 37
고여 있는 사람 38
제2부
단꿈 41
몽촌토성에서 42
김치국물―성은 아우에게 44
입―일규에게 46
갯벌에서 48
아시아실잠자리 49
달빛―보원사 폐사지에서 50
혼자 부르는 노래―열두 개의 가방 51
벚나무집 복실이 52
버찌가 익어갈 무렵 54
눈발 56
양송정 옛집 58
넙치 몇 마리 60
십 년이 지나 61
이런 날 62
옛집 64
모자 66
제3부
고백 69
오래된 마당 70
유월에 쓰는 편지 72
유언遺言 74
설날 아침에·2 75
우리라는 이름의 당신―故 엄창호 회장을 추모하며 76
희고 고운 모습으로―시집가는 딸에게 78
가지 80
수국이 피는 저녁 82
일빠의 꿈 84
송편 85
서른의 리이 86
대부섬 바위―만경 형에게 88
그늘―석록에게 90
설날 아침에·1 92
발길질―남아공 월드컵 8강전에서 이동국의 슛 94
고달사 폐사지에서 96
숫돌 98
제4부
집 101
냇가로 가자 102
동행 104
사리 105
산보 106
마을버스 108
조그마한 사람 110
사레 111
춘분에 쓰는 편지 112
청명에 쓰는 편지 114
불면 116
자작나무에게―인제 원대리에서 117
셔틀콕을 치면서 118
겨울 두견이 120
옻 121
해설/고명철 경이로운 것들에 대한 경의敬意
―손제섭의 시세계 123
4. 평가
손제섭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지난날의 경이驚異에 경의敬意를 표하고/오늘은 이 무덤덤함을 찬탄한다.”고 나지막이 읊조린다. 문득, 궁금하다. 시인에게 과거는 어떤 것들로 이뤄져 있기에 경이로우며, 또 그 경이로운 것들의 속성은 어떤 것이기에 존경스러움을 동반할까. 그리고 이러한 과거를 겪어온 시인에게 현재는 요란법석을 띠는 삶의 난장과 거리를 둔 ‘무덤덤함’을 자아내고 있는, 그래서 생의 활력이 스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은 도리어 이 “무덤덤함을 찬탄한다.” 사실, 손제섭의 이번 시집을 감싸고 있는 시적 상상력은 시인의 개별 경험이 녹아 있는 과거의 숱한 삶들 사이에 오롯이 놓여 있는 작은 것에 대한 경이로움과 그것이 지닌 값진 가치를 발견하는 현재적 삶의 ‘무덤덤함’이다.
5. 작품
몽산포 타령
몽산夢山을 걸었네
사구沙邱에서 춤을 추네
누군가를 보았고
누군가를 잊었네
몽산포 흰 모래가 웃었고
몽산포 붉은 바다가 울었네
소슬한 꿈속의 꿈이었네
이름 모를 별
할매 내가 왔다
한이가 왔다
심봉사 청이 만난 것처럼 눈 떠라
달래 뿌리 같은 머리를 이고 쥐똥나무 열매 같은 이빨을 물고 녹슨 호미 같은 귀를 달고도
나 못 보면 눈 감지 않겠다던
할매 이제 눈 떠라
할매 내가 왔다
한이가 왔다
굳은 혀를 풀고 이제 말해라
철없는 흔들림으로 한때 자갈길을 달리고 적막강산을 당나귀처럼 달리며 끼룩끼룩 울었던
내가 왔다
할매 이제 말해라
할매 내가 왔다
한이가 왔다
한생을 지고 온 밥그릇 내려놓고 하늘로 가라
여기 낯익은 사람들 모여
촛불 켜고 향 피우는데
저만치 이름 모를 별 하나 지네
저 별
가슴에 담아 둘게
할매 이제 하늘로 가라
정情
―아우 복도에게
씨왈거리는 남도 사투리로
밤늦도록 퍼대다가도
전봇대를 애인인 양 오래 끌어안아 보다가도
마흔 넘어 얻은
미루나무 연초록 이파리 같은
내 새끼 자는 집으로 가야 한다고
천둥처럼 지르는 소리에는
허풍은 간데없고
순정이 넘치는데
난초 같은 색시가 아침상을 보는 동안
‘사람끼리 서로 정情이란 놈이 없으면 무슨 재미여’라고
한소리하고 뒤로 자빠져버리는 통에
돌 지난 막둥이가 아가리를 있는 대로 벌리며 우는 모습이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
아!
참말로 맥박이 뛰는
조선朝鮮 남아의 정情이여
그 집
문을 열자
운동화 한 켤레 옥잠화처럼
배시시 웃고 있는
내 영혼이 내릴 자리
굽 닳은 구두를 그 곁에 나란히 벗어둔
이별의 품사
꼭꼭 입 다물고
숨을 죽이고
이제 그만 고개를 돌릴 때
동백이 진다
누군가를 보내는 일
누군가 다시
도돌이표처럼 돌아온다면
명치끝에 걸려 하지 못했던
눈물의 그 말 한마디
- 이전글제11회 김구용시문학상 수상자 백인덕 시인(수상시집 '북극권의 어두운 밤') 선정 20.12.26
- 다음글고창수 시인(리토피아 고문)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주관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에 선정 20.11.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